business field
business field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신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현상의 세계 뒤에 있는 궁극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궁극의 실재, 태극 太極, 무극 無極인 그 마지막 존재, 그것이 무엇인가? 철학사를 보면 밀레투스 Miletus 학파의 탈레스 Thales(640~546 B.C)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민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하는 질문을 던진 것은 분명히 인류 사상사에 새로운 파문을 던진 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현상의 세계, 날마다 눈으로 보는 세계와는 다른 실체의 세계, 참된 모습의 세계를 찾는다는 구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는 인류의 지식욕은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철학은 항상 이 문제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었고, 그것을 다루는 「형이상학」이란 이름도 철학사만큼 오랜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1원론 imonisn, 둘이라고 생각하면 2원론 dualism, 여럿이라고 생각하면 다원론 pluralism, 또 하나라도 물질뿐이라면 유물론 materialism, 마음뿐이라면 유심론 idealism 따위로 한없는 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궁극의 실재를 논하는 것은 존재론 ontology 이라는 것이 본 이름이고, 그것은 「형이상학」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존재론에 관해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만을 골라 보려면, 우선 동양의 것을 들출 수밖에 없다. 특히 인도적인 불교적인 존재론을 여기서 맨 앞에 가져온 이유는 철학사상에서 인도 철학만큼 발달한 또는 복잡한 철학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베다」 Veda에서 시작해서 「우파니샤드」 Upanishad 철학과 대승 Ma-hayana 불교를 통하여 더욱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실용주의자요 공리주의자였던 중국인에게 무아 無我 주의, 이타주의, 고행 수도를 가르친 것도 이 대승불교였고, 윤회전생 輪廻轉生 과 살신성불 殺身成佛 과 극락왕생 極樂往生 을 가르친 것도 이 것이었고, “일념삼천 一念三千”이니 “심외무별법 心外無別法”이니 하는 서양철학이 옆에도 못 따라 갈 복잡한 유심론 唯心論 을 알게 한 것도 불교의 덕택이었다. 그런데 「베다」 Veda 에서 「우파니샤드」를 거쳐 불교에 이르기까지 그 근본을 꿰뚫는 궁극의 실재는 “고 苦” 한 가지였다. 만물의 근본에 고 苦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해탈 解脫 의 길이 모색되었고, 그래서 고행 苦行 도 요가 Yoga 도 나오게 되었다. 물론 「우파니샤드」 의 존재론은 만물의 근본에 브라만 Brahman(범 梵)이 있고, 그 분자로 아트만 Atman(아 我)이 삼라만상을 이룩하고 있으나, 아트만은 브라만과 근본이 같은 거, 따라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그것이 바로 너 자신” That art thou 이다. 그런데 이 “그것이 바로 너”임을 모르고 보이는 모든 것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마야 Maya(미 迷)다. 우리는 이 “마야”의 환각 속에서 사는 한 고 苦 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생이 범아일여 梵我一如 임을 알리기 위하여 쓰라린 전세・현세・내세의 윤회전생 輪廻轉生 이 계속된다. 일체의 생물은 전세의 카르마 Karma(업 業)에 따라 현세에서 인과응보를 받는다. 따라서 선업을 쌓아 이 윤회전생이 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크샤 Moksha(해탈 解脫)이다. 이 해탈은 고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파니샤드」철학의 골자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역시 인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숙명적이고 저주스럽고 참혹한 고통인 카스트 Caste 제도 때문이다. 인류사회에 다 계급제도가 있으나, 정상수단으로나 비상수단으로나 혁명으로나 모두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될 수 있다.” 그런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은 수천년 동안 아니 20세기 현재까지, 여하한 혁명으로도 여하한 비상수단으로도 깨뜨려지지 않는 저주받은 고생으로, 음지는 절대로 음지대로 남는 제도였다. 따라서 궁극의 실재가 고 苦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 이것이 불교의 존재론의 기초가 되었다. 물론 불교의 존재론이 무엇이다라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삼천대천세계 三千大千世界 의 space 와 무량각 無量却 의 time 을 파악하는 불교, “비유비무 非有非無 일체개공 一切皆空”의 공관 空觀 을 가진 불교, 유심론도 유물론도 범신론도 다 포함하고 있는 불교에서 그 존재론이 바로 이것이다. 하기는 힘든다. 그러나 설법 이 불경 결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8만 대장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불교의 성립, 이런 경위로 보아서, 불교가 요약한 교리란 4체(四諦) 8정도(八正道)밖에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며, 이 공식에 의하면 역시 궁극의 실재가 고 苦 였다고 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것 같다. 사체 四諦 란 네 가지의 진리를 말한다. 체관 체념의 뜻인 체 諦 는 진리의 인식 혹은 깨달음이다. 그것이 “고 苦・집 集・멸 滅・도 道”였다. 존재론과 인식론이 결합된 사상체계인 이 4체는 우주만물의 생성과 그 실상을 캐내고, 인생의 도달목표에 이르는 인과율을 설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여기서 우선 이 세상은 고 苦의 세상이라는 우주상 혹은 세계의 “이미지”가 부각된다. “생자필멸 生者必滅” “회자정리 會者定離”의 고통과 비애는 인생의 본질이요 세계의 본질이었다. 삶도 고 苦, 죽음도 고 苦, 아픔도 고 苦, 행복을 찾는 것도 고 苦, 만나면 이별이 있는 것도 고 苦, 어디를 보나 고 苦 뿐인 사고팔고 四苦八苦의 세상, 조금만 정신차려 반성해 보면 인생은 바로 고생 바다고 이 세상에 고생을 하러 나온 것이다. 이래서 고체 苦諦가 깨달음의 출발점이 된다. 그 다음은 집체 集諦이다. 이미 고 苦가 있음을 안 이상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욕심 욕망에 매달리는 집착(執著)에서다. 이 고 苦의 세상에 대한 애착・집착은 몸과 입과 뜻의 3방면에 나타나 업 業을 만들고, 그 업 業으로 말미암아 인과응보를 받고 108번뇌의 세계에 사람은 가라앉고 만다. 이것을 해탈하는 길을 찾는 것이 멸체 滅諦이다. 멸체는 인생고를 단절하고 열반 nirvana(涅槃)에 도달한다.
열반이란 반드시 죽는 것만이 아니라(물론 사후의 영생을 얻는 뜻에서) 욕망을 단절한 자유의 생활에 들어간 기쁨을 뜻한다. 그러면 그 고 苦를 단절하는 방법은? 그것이 도체 道諦이다. 도체는 팔정도 八正道를 깨달음이다. 바로 보고(정견 正見), 바로 생각하고(정사유 正思惟), 바로 말하고(정어 正語), 바로 행동하고(정업 正業), 바로 생활하고(정령 正令), 바로 노력하고(正精進) 하는 것이, 생 生・노 老・병 病・사 死의 사고 四苦와, 미움과 원망에 붙들리는 괴로움, 사랑을 이별하고 떠나는 괴로움, 구해도 원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결국은 오음 五陰이 한 곳에 모이는 괴로움(이상 합계 팔고 八苦)을 면하는 길이라고 불교는 가르친다. 오음 五陰이란 육체, 감각, 생각, 행동, 인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탈하는 실천계명으로 오계 五戒를 가르친다. 5계란 죽이지 말라(불살생 不殺生), 훔치지 말라, 음탕하지 말라, 허튼 말을 하지 말라(불망언 不忘言), 주정하지 말라(불음주 不飮酒)의 다섯 가지였다. 아무튼 고 苦라는 존재 없이는 인도 철학은 성립이 안되는 것이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나가자니 허무주의도 나올 수 있다. 철학사상에 허무주의 nihilism 는 끊임이 없다. 그리고 그 원산지는 고 苦가 실재라는 인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시 가장 오래고 가장 넓은 영향을 끼친 허무주의는 중국의 노장 老莊 철학일 것이다. 노자 老子라는 인물의 실존조차도 의심되고, 또 실존했더라도 그는 인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만큼 노장 老莊 철학은 어느 한 사람의 시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자도덕경 老子道德經」 같은 책은 분명히 인류문화의 고귀한 상속품의 하나이다. 노장 老莊 철학이란 지나친 기교주의, 지나친 미장원 문명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 미장원 문명은 분명히 사회의 몰락과정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공맹지도 孔孟之道는 그것을 예 禮로 바로잡아 보려 했다. 그런데 노장 老莊 철학은 그런 헛수고는 그만두라는 권고였다. 예 禮라는 것이 예의도 아니고 에티케트도 아니고, 부모의 초상을 빚을 내가면서라도 거창하게 치르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서도 3년 상을 입을 동안 삭망(朔望)을 지내고, 제사를 올리고 하는 죽은 가족에 대한 효도 따위의 형식이 예 禮였다. 따라서 그런 사회질서에 욕을 퍼부을 만도 하다. 노자 老子도 공자 孔子만큼 세상을 구제하고 싶었으나 방법이 달랐다. 문명에 병든 사회를 뜯어 고치려면 차라리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아마 노장 老莊이 말하는 도 道였을 것이고, 여기서 도교 道敎라는 민간신앙과 미신과 허무주의의 결합체인 종교도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럼 도 道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자 孔子가 말한 도 道하고는 전연 거리가 먼 도교 道敎 Taoism 의 도 道다. 그 도 道란 무시무종으로 천지간에 충만한 근본원리이나, 이름을 붙이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형태를 끊고, 소리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는 “무상 無狀의 상 狀, 무상 無象의 상 象” state of no-state, image of no-image 그것이 도 道다.
천지에 앞서 존재했고, 천하의 어머니로서 존재했으나, 황홀하고 고적하고 이름 없고 돌고 도는 그것이 바로 도 道. 결국 그것은 무 無밖에 될 것이 없다. “천지만물은 有에서 나오고 有는 無에서 나왔다.” 이것이 노자 老子의 생각이었다. 有는 현상이고 無는 물자체 物自體. 有는 Atman, 無는 Brahaman, 그래서 허무 일원론의 노장 老莊의 실존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 道는 1을 낳고,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고, 3은 만물을 낳는다.” 따라서 無는 허무이면서 못하는 짓이 없다. 마치 풀무와 같은 것, 텅텅 비었어도 움직이면 바람이 나고, 그 바람이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이 무쇠를 녹이는 것같이, 이 허무도 움직이면 천 天・지 地・인 人 안 생기는 것이 없다. 그 작용은 영원하고 위대하면서도, 성공은 했으나 이름은 없고, 만물을 입혔으나 주인이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도 道이니, 사람들은 이 도 道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道를 법으로 삼고, 道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이 자연 역시 nature가 아니라 무위 無爲, 따라서 이에 말한 허무를 뜻했고, 모든 인위 人爲란 다 거짓(僞)이라 했다. “천도무친 天道無親 상여선인 常與善人”이라는 무친 無親도 역시 주인이 없는 허무의 뜻이었다. 결국 도덕은 무욕주의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러자니 無爲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연으로의 복귀를 老莊은 역설했던 것이다. 따라서 “생물이 무성하면 곧 늙는다. 이것을 부도 不道라 한다. 부도 不道는 일찍 그친다” 했고 “감히 천하에 앞장 서지 말라”, “공을 이루고 몸을 빼는 것은 하늘의 길이다”했고, 천하의 골짜기가 되어서 만물이 다 그 위로 흘러가게 버려두라고 그들은 말한다. “사람이 산 표적은 유한 것, 그가 죽은즉 뻣뻣해진다. 만물초록이 생명이 있은즉 부드럽고, 죽은즉 고갈한다. 그러므로 강견 剛堅은 죽은 무리, 유약 柔弱은 산 무리”하 했고. “천하의 유약, 물보다 더한 것은 없으되, 강견한 것을 부수는 데 물보다 더 한 것이 없다.”했다. 그러니 그들은 일종의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생이 글을 배우는 것이 우환의 시초”라고도 했다. 정말 골치 아픈 세상에 대한 좋은 충고이기도 하다. 「노자도덕경 老子道德經」과 아울러 「장자 莊子」 「열자 列子」라는 책들도 다 같은 계열의 사상을 더 잘 나타내고 있고, 특히 「장자 莊子」는 노장 老莊 철학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물건의 시작인 무시 無始가 있고, 무시 無始의 앞에 무무시 無無始가 있다. 마찬가지로 만유의 근본은 無지만 無 앞에는 無無가 있고, 無無 앞에는 無無無가 있다. 그래서 “태극 太極이며 무극 無極”이란 無의 실재가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이 무극으로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자 莊子의 견해였다. 그가 본 생사문제는 3단계로 되었었다. 우선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함은 일반의 상식, 다음 道에서 나온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道로 환원하는 것이라 슬플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생은 싫어지고 사는 기쁘게 느껴질 것, 셋째는 더욱 높은 차원에서 생사는 상대적인 것, 그러나 道에서 볼 때에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다만 생사가 같은 것, 따라서 생사를 초월하는 게 道에 합치된 생활이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관이 된다고 했다. 莊子는 인생이란 일장춘몽, 정말 만화적 존재라고 본다. 그의 유명한 “당랑(螳螂)이 뒤에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의 희한한 캐리커춰다. 여름철 더운 날 서늘한 높은 나뭇잎 그늘에서 매미가 상쾌하게 노래 부르고 있다. 당랑(범아제비)이 맛좋은 미끼가 있다고 생각해서 슬슬 매미 뒤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 하늘에서 이 달랑을 정찰한 까치는 쏜살 같이 당랑을 잡아먹으려 기수를 내려뜨린다. 까치를 발견한 포수는 좋은 사냥감이 생겼다고 활을 다려 화살을 까치에 겨누고 있다. 이것이 유명한 “당랑 재후”(螳螂在後)란 인생 만화다. 그러니 우리는 다 속아 사는 것, 어찌 염세와 허무가 안 나올 수 있으랴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옛날부터 존재에 관한 사색은 한이 없었다. “비유비무 非有非無, 일체개공 一切皆空”이란 「공」의 존재에서부터, 무시무극 無始無極의 無의 존재를 거쳐, 만물은 흘러간다는 「흐름」의 존재에까지 그 이론을 다 열거하려면 한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스콜라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의 분기점을 이룬 르네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3세기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1650년 54세로 작고) 아직까지도 그가 살던 시대의 사상적 풍토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프랑스에서 나서 가톨릭적 교양을 쌓고, 그 자신의 말을 빌면 “유럽에서 은퇴해서” 네델란드에서 저작에 골몰하다가 죽은 지성인이었다. 그는 정상적인 지성인의 교양을 받고, 그가 받은 교육의 전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이미 받은 모든 교육을 다 집어던지고, 백지롤 출발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다시 써 보되, 일체의 회의주의는 집어치우고 명확하고 뚜렷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아 들이이기로 작정하고 나섰던 것이다. 일체의 “기성”에 대한 불신, 일체의 낡은 것에 대한 의심, 이것은 데카르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의 정신적 풍토이다. 데카르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선 의심하는 것부터 개척했다. 말하자면 「의심학」이란 것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의심학」에도 종착역이 있었다. 그것은 의심하는 자로서의 나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 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 의심스러운데, 모든 것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유명한 데카르트의 대명사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의 결론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파악한 그는 적어도 신의 존재와 물질의 존재, 다시 말해서 마음의 세계의 존재와 바깥 세계의 존재 두 가지만은 그에게 확실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물심 物心 이원론 二元論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업과 아울러 절대로 회의론에 빠지지 않게 틀림없이 확실한 것을 찾아내는 과업을 동시에 병행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I think, therefore I am”을 알아냈고, 나의 존재란 바로 생각하는 존재란 결론까지 확실해졌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다. 무엇이 존재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할 것, 無에서 有는 안 나올 것, 大가 小에서 못 나올 것. 그런데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 예를 들자면 무한한 존재이며 창조자인 신이란 관념도 존재한다.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밖에 많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無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의 모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나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된 존재가 아니며, 또 내 마음이 꾸며낸 소설도 아니며, 마치 나는 생각하는 고로 존재하는 나의 존재가 내재적인 것같이, 그것은 나에게 내재적 innate 인 것이다.
신이 나를 창조했을 때에 나에게 내재적으로 이런 관념을 부여해 준 것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마크”를 붙여 놓은 것과 같다. 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신에 대한 관념도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못 가졌을 것이다. 신은 나를 속이지도 못하고 속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래서 의심의 천재 데카르트는 나와 신까지는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다음 그가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은 감각된 물질의 존재였다. 의심할 수 없고 틀림없는 진리의 존재는 오직 신에 대한 지식에서부터라고 생각했던 데카르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을 얻게 되었다. 감각된 사물의 존재를 받아 들이고 인식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신이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을 안 이상, 그 감각된 물질의 또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궁극의 실재, 맨 마지막의 진짜의 존재는 나와 신과 물질뿐이라는 결론을 내려졌다. 이래서 과거와 결별하고 기성에 반기를 들도, 미래를 향해서 재검토 재출발하는 사색의 전환점이 “Cogito, ergo sum”, 말을 바꾸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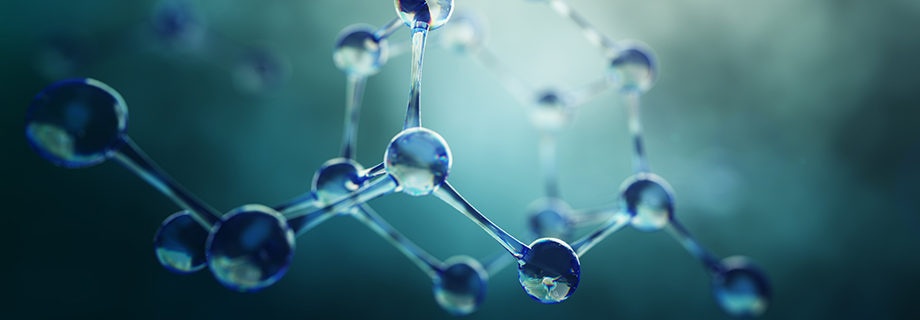
데카르트의 사색은 너무 철학적이었다. 궁극의 실재가 무엇이냐를 좀 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 그것은 그냥 물질뿐이 아닌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물질들, 분자들, 원자들, 소립자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유물론의 역사는 서양 철학사만큼 오랜 것이나 근세에 와서 더욱 앞장을 서게 되어, 심지어는 유물사관까지 나오게 되었다. 여기서는 순수한 형이상학으로서의 근세 유물론의 출발을 영국의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1588~1679)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데카르트의 벗이었고 비판자였던 홉스는 91세로 작고할 때까지 혁명정치가로서 자연과학자로서 길고도 바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철학에 있어서 그 때까지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토마스의 전통을 완전히 탈피해서 데카르트식 타협을 안하고 새 길을 뚫어 보려 애썼다. 그는 마치 공맹지도 孔孟之道에 반기를 든 순자 荀子와 같이 성악설 性惡說을 주장하고, 인간이 본시 악하기 때문에 전제군주에 의한 의법처단과 강력한 국가주권의 발동 이외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종교는 “씹지 말고 삼켜야 할 환약”이라고 생각했다. 지동설의 갈릴레오와, 혈액순환을 알아낸 하비 William Harvey 와 친했다는 것밖에, 그리고 그의 말대로 “기하학과 연애를 했다”는 것밖에는 본시 과학자로서 양성되지도 또 과학적인 성격을 지니지도 않았던 그는, 크롬웰의 퓨리탄 내란 전후 50년 동안 정치적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거숭이로 나타난 인간 본성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것뿐 그것은 마치 전국시대 戰國時代의 순자 荀子의 환경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시랑이, homo homini lupus”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bellum omnium contra omnes“이니 하는 말과 아울러 괴물같은 「국가론」 Leviathan을 썼다. 따라서 홉스는 프랜시스 베이콘에서 죤 록크에 이르는 영국 경험론 철학이 거두들과 맞서는 거물이었으나, 사상적 연관은 찾기 힘든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아마 영국 근대화 과정 시초의 격동기가 낳은 하나의 기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아마 시엔시아 scientia 란 말을 진정으로 사이엔스 science 와 필로소피 philosophy 로 구분해 놓은 원조일 것이며, 특히 물체의 운동이란 관념으로(De corpore) 새로운 윤리학과 정치학,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De cive)을 만든 시조가 될지 모른다. 적어도 그는 근대 사상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지식의 기초 위에서 존재에 관한 모든 지식의 근원을 찾도록 만든 예민하고도 정력적인 사상가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특히 그는 근대에서 가장 심오한 유물론 체계의 창설자인 동시에 영국 심리학의 창설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는 말했다. 철학은 세상의 아들이요, 또한 그대 마음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와 같이 처음에는 혼잡했다. 그러나 차차 정리를 해서 가를 것은 가르고, 보낼 것은 보내고, 남을 것만 남게 되었다. 철학은 신학을 제외한다. 철학은 역사도 자연과학도 제외한다. 철학은 모든 빛과 말로 장식된 치장도 제외한다. 철학이란 일편의 물질인 body(corpus)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시초를 알고, 그것과 다른 것과의 비교가 가능하고, 그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던 우주 공간의 어느 부분엔가에 붙어 있는 그런 물체 body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이다. 이것이 그의 「물체론」 De Corpore이다. 따라서 세계는 물체로 되어 있고, 물체가 아닌 것은 우주의 부분이 아니다. 우주란 물체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물체 이외의 실재의 존재란 우주 안에는 없다. 그리고 그 물체는 움직인다.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 matter in motion 만이 실제이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는 필연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이상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는 이상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래서 물질은 운동과 필연적 원인을 갖는다. 이러한 결정론적 견해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를 알면 미래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물론 materialiism 과 결정론 determinism 다음에는 기계론 mechanism 과 감각론 sensationism 이 나온다.
즉 생명이란 것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인 이상, 우리는 그 자체의 용수철과 바퀴로 움직이는 자동기계 시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팔다리에도 인공적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심장도 용수철, 신경도 실 타래, 관절도 바퀴들, 다 몸 전체를 움직이는 자동장치들 아닌가? 그러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자유의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인간도 순전히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그의 「인간론」 De homine 으로 홉스는 또한 기계론자가 되었다. 형이상학이 유물론이면 인식론은 감각론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오는 것밖에 어찌 더 인정을 받겠는가? 인간의 생각은 감각에서 근원된 것, 감각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나타날 것이 있을 리 없다. 인간의 상상이란 감각이 흐려진 것뿐, 따라서 감각된 시간이 오래면 오랠수록 상상력도 약해진다는 것이 홉스의 논리였다. 그러나 감각은 대리 인식을 하는 것뿐, 외부 세계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는 심리학을 내세운다. 그것은 감각도 운동이고, 외부의 감각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내부로 들어가서 그것을 인식할 때에는 벌써 진짜 모습을 대리하는 어떤 대표자를 안식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감각은 주관적인 것, 따라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 그래서 행복이란 것도 자기 만족뿐이란 것이 홉스의 결론이었다. 이래서 물체를 토대로 한 「인간론」과 함께 물체를 토대로 한 「시민론」 De cive 도 나올 수 있었다.

홉스의 유물론은 17세기 사상계에서는 큰 유령이었다. 물질만이 존재하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과학의 진보는 점점 그 편을 드는 것만 같았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 욕설, 무시 등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으나,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으로 근대 관념실재론 idealism 철학을 세워 이름을 떨친 것은 18세기 영국 성공회 주교 바클리 George Berkeley(1685~1753)였다.
그는 물질이란 무엇이냐? 우주를 구성하는 그 수 없는 body 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우리 마음 속에 인식된 것이냐? Locke가 바로 그렇게 말했다. 우리 마음은 백지고 최초에 감각에 없었던 것은 마음에 있을 수 없다고. 따라서 감각됨으로써 인식된다는 사실로 우리가 물질 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된 이야기고, 도리어 그것은 물질이 마음의 형태로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교묘히 역습을 하는 것이 바클리의 예지였다. 이야기는 간단한 것, 우리가 덮어놓고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오직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지 그밖에 물질이 무엇이냐? 전 유럽이 유물론의 유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을 때에 오직 이 애란의 명석한 두뇌가 간단히 이것을 몰아낼 수 있었다. 어떤 사물이란 다만 감각의 통합체일 분, 다시 말해서 감각의 분류와 해석이 어떤 사물이지 그 밖에 무엇이냐! 물론 내 조반상이 그냥 감각의 통합체가 아닌 구체적인 물질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또 목수가 집을 짓는 대패와 톱은 감각의 통합체가 아닌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반은 분명히 처음에는 눈과 코와 손의 감각의 대상에 불과하고 그 다음은 맛이고 그 다음은 내적 만족이고 흐뭇함이다. 톱과 대패도 마찬가지로 빛, 크기, 형태, 무게, 촉감 등 그 실재성은 그 물질성이 아니라 바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뿐이 아닌가? 만일 그대에게 감각이 없다면 톱과 대패는 그대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 무감각한 손을 자를지 몰라도, 그대는 영원히 그것을 연장으로 인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건이란 오직 한 뭉치의 감각일 뿐, 다만 마음의 한 상태일 뿐, 우리가 아는 한 모든 물질은 우리 마음의 상태 뿐이지 실재는 아니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 아니냐는 것이 바클리 주교의 주장이었다.
물질의 운동, 확대, 축소, 색채 등이 도대체 우리 마음 속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가? 그러면 matter in motion 인데 motion 이 우리 마음 밖에는 없다면 matter 도 우리 마음 밖에는 없는 게 아닌가. 크고 작고, 많고 적고, 하나고 여럿이고, 차고 덥고, 다 우리 마음의 인식뿐이다. 따라서 바클리는 유명한 “존재 즉 지각, esse=percipi”이란 공식을 발표했다. 존재란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것, 그렇다면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다 관념적이란 말인가?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과 집과 골목과 돌멩이들도 한낱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반격에 대해서 바틀리는 미리 대답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것은 그런 구체적 물건들 thing이 존재라지 않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물체 body 또는 물질 mstter이라는 것이 관념보다 더 뚜렷한 실재라는 그 점에 대한 반대라고 바클리는 말한다. 우리는 결코 관념을 먹고 마시고 입지는 않는다. 어떤 구체적 물건이 결코 idea 는 아니다. 물건은 어디까지나 물건으로서 존재한다. 문제는 존재가 지각된 것, 인지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정원의 나무도 방안의 의자도 눈 감으면 안 보이고 눈 뜨면 보이고 하는데, 그 때마다 소멸되었다 되살아 났다 한다는 말인가? 이런 반격에도 대답이 마련되어 있었다.
바클리는 말한다. 홉스의 과오가 바로 그것이 아니냐고. 주관적 감각에 의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재는 객관적인 인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니, 도리어 반대라고 그는 말한다. 물질과 운동이 실재가 아니면 자연과학은 무시되는 것이냐? 자연과학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에는 idea 에 의해서 한다. 어떤 철학자도 물질이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어떤 idea 를 낳는지는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자연과학의 존재도 어떤 형태・운동・분량 등에 관한 문제이지 “물질” 그 자체의 인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Copernicus 가 지동설을 발표한 지가 오래되었어도 사람들은 “해가 든다, 해가 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다고 자연과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는 진짜의 존재가 무엇이냐? 물질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지각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따라서 matter 니 body 니 하는 것도 감각된 idea 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관념실재론을 플라톤 이후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클리였다.

존재란 무엇인가? 물질인가? 마음인가?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이번에는 데카르트, 칸트와 아울러 근대 철학의 문제아의 또한 사람 쇼펜하워 Arthur Sehopenhauer(1788~1860)의 주장을 들어 보자. 72세로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고, 의심 많고, 딱딱하고 하던 이 독일 사상가는 자기 어머니 하고도 싸워서 헤어지고, 괴테 Goethe 하고도 싸워서 헤어지고 하면서 「의지와 관념으로서의 세계」(1818)걸작을 내고, 베르린 대학의 철학 강사를 해 보려 했으나 그가 말하는 엉터리 헤겔 Hegel stsodsla 때문에 빛도 안 났다.
19세기 초는 기묘하게도 비관주의자들이 많았던 시대였다. 영국 시인 바이론 Byron, 독일 시인 하이네 Heine, 로시아 시인 푸시킨 Push-kin, 그리고 음악가에도 슈메르트, 슈만, 쇼팡, 심지어는 억지로 비관주의를 감추려고 낙관주의자로 자처하던 베토벤, 그리고 이 모든 위에 비관주의의 대왕으로 군림하던 것이 바로 쇼펜하워였다. 그래서 30세의 청년이 저주의 명문집 「의지와 관념으로서의 세계」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 정말 사람들은 깜짝 놀랐었다. 왜 19세기 초가 이렇게 비관의 시대였을까?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 도중에서 나폴레옹 제국으로 바뀌고, 또 나폴레옹 황제가 성・헬레나 섬으로 귀양을 가고 하던 시대, 다시 말해서 의지는 꺾이고, 죽음만이 전 유럽의 전쟁터를 덮고, “혁명의 자식”은 먼 고도의 바위 위에서 썩고, 오직 절망만이 유럽의 젊은 마음을 지배하고 하던 그런 시대의 소산이 이 비관주의 pessimism 였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워의 독특한 철학 의지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설 主意說 voluntarism 이 나타났다. 쇼펜하워는 유물론과는 대조되는 궁극의 실재는 의지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존재는 의지, 의지는 만물의 근원, 말하자면 일종의 저주와 비관주의의 인식, 다시 말해서 썩은 놈의 세상에 대한 비난과 탈출구의 발견, 그것이 그의 철학의 전부였다. 인생의 목적이란 바로 고난을 겪는 데 있지 않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생명 그 자체와 분리시킬 수 없는 필요와 욕구에서 나오는 세계 도체에 산더미 같이 쌓인 그 많은 고통이 무의미하고 무목적하고, 우연의 소산이라고만 본다면, 그런 어리석음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는 백정이 노리고 있는 들 가운데 양과 같은 존재, 운명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불행을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불안은 인류 존재의 등록 상표 같은 것. 우리는 산비탈을 뛰어 내려 오는 사람처럼, 뛰지 않으면 제 다리로 지탱할 수가 없다. 누구이든 간에, 아무리 오래 살려고 애쓸 대상이 될 수 없다. 누구이든 간에, 아무리 야심 투심이고 아무리 죄악투성이고 간에,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관론을 늘어 놓는 이유는 그러므로 모든 것의 내적 본성은 의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데서이다. 우리의 의지로 알려진 가장 직접적인 지식으로 나타나는 그것도, 또한 세계의 모든 현상에서 정도를 달리해서 표현되고 객관화되는 것뿐이다. 모든 냇물이 바다를 향해서 바쁜 걸음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이나, 모든 지남철의 양 끝이 기어코 남극 또는 북극을 향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나, 모든 물체가 곡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만물의 뒤에 숨은 실재, 진정한 존재라는 것은 의지 will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쇼펜하워는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범신론 pantheism 과 같은 것인가? 아니다. 범신론이란 세계가 바로 신이라는 생각, 다시 말해서 실재는 만물에 표현된 신 자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신이 이 보잘것 없는 빈민굴 같은 세상 속에 들어 있겠는가? 그렇다고 전지전능하신 신이 만든 걸작이 이 잘난 세상이고, 이 꼴불견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쇼펜하워의 「주의설」은 범신론도 아니요 유신론도 아니요, 그저 물리 화학적인 물질적인 이 세계의 근원이 의지라는 것 뿐이다. 그 의지의 가장 단순한 객관화가 예를 들자면 인력의 법칙, 불가입성 impenetability 등이다. 이 때까지 의지란 힘 force 에 종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쇼펜하워는 그것을 뒤집었다. 즉 자연의 모든 힘은 의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 의지란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재적인 것이며, 감각이나 지각 이전의 궁극의 실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물체나 인간 세계에 이르러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끊임없는 의지의 투쟁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존재 의욕, 생의 의욕, 정복 의욕, 번식 의욕, 모두가 의지의 연속이지 그 밖에 무엇이 있느냐고 쇼펜하워는 묻는다.
인간은 언제나 욕구불만의 동물이다. 밤낮가야 만족할 줄 안 적이 없다. 왜? 그것은 만물의 근원이 의지이기 때문, 의지가 세계의 왕이요, 만물이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 그래서 어느 하나도 만족을 주는 게 없고, 있다면 천하를 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이 없는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인생은 비참과 절망의 연속이다. 여기서 왜 살려고 애쓰는가? 이래서 쇼펜하워의 비관주의는 절정에 도달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존재론을 다루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면 차라리 형이상학이 없는 것이 낫겠다는 이론도 나올 만하다. 그래서 현재는 형이상학 무용론과 형이상학 유용론이 삼각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며 어떤 철학책은 아주 형이상학을 빼 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되어 버릴 수는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존재라는 개념에는 최고의, 가장 보편적인, 따라서 그 이상 더 다른 여러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따. 따라서 존재의 영역은 일체를 포괄하는 초월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존재를 사색하는 일은 철학적으로 무의미한 일이 아니니, 적어도 그것은 우리의 논리적 과학적 사고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존재라는 말은 다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 실존(existentia), 본질(essentia), 실체(substantia), 우존(accidens), 현실유(actus), 가능유(potentia) 등의 구별이 있고, 또 경험세계에서 존재는 네 개의 근본 종류가 있다. 즉 주기적 존재, 유기적 존재, 감성적 존재, 영적 존재가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란 말을 마구 쓰지만 정말은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다. 따라서 존재론을 연구하는 형이상학이 그리 쉽게 버림을 받을 수도 없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것이 실존하는지 않는지, 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실존 즉 existence 혹은 Dasein 의 문제이며,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본질 즉 essence 혹은 Sosein 의 문제이다. 그리고 실존이 없는데도 실존할 수 있는 본질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Dasein 과 Sosein 은 구별되는 것이다. 또 Dasein 이 소멸되었을 때에도 Sosein 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은 실존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Sosein 이 없는 Dasein 은 없다. 실존하는 이상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존이 없는 현실적인 본질도 없다. 그러면 실존과 본질은 존재의 다른 두 요소인가? 혹은 같은 것은 양면인가? 이것은 오늘날 실존철학이 다루는 근본문제가 되어 버렸다. 존재의 또 다른 구분은 현실유 actus 와 가능유 potentia 의 문제이다.
우리는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 상정할 수 있다. 즉 완전한 유와 완전한 무의 중간물이 가능유 potentia 다. 그것은 아직 안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될 수 있는 능력・소지도 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potentia 는 현실유 이전에 존재한다. 그러나 가능유는 그 가능의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유의 주체를 안 가진 가능유란 존재할 수 없다. 또 존재의 구별에는 실체(substantia)와 우연유(accidens) 즉 우유(偶有)가 있다. 우리는 행동과 경험에서 변화하면서 동시에 동일하다. 내가 무식했다가 학자가 되었다거나, 내가 청년이다가 장년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자기 동일보존의 계기는 변화의 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동일보존은 변화의 지주처럼 받침대 노릇을 한다. 이것이 바로 “실체”와 “우유”의 구별이다. “우유”란 따라서 자체 존재가 아닌 타립적 존재이며, 실체는 반대로 자립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유”란 존재의 변화・활동・상태・양상 등에서 나타나는 존재를 말한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의 “있다”는 모든 존재에 대한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그 개체에 대해서 1회성의 것에 불과하다. 모든 존재에 있어서 일치하나, 존재에 있어서 개별적이라는 역설이 이래서 나올 수 있다. 존재의 유사성 analogy 이 있으면서 또한 1회성뿐이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존재에서 두 개의 존재 사이에 전연 동일이라는 것도 없고 전연 판이하다는 것도 없다. 적어도 존재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가진다. 이것이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또 그러기 때문에 존재론이란 형이상학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형이상학 무용론이 나오다가 다시 독일 관념론의 최근의 발전은 실존 Dasein 이란 문제를 들고 형이상학 복구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실존 혹은 현존재 Dasein 란 말을 만들어 낸 하이덱거 Heidegger 에서 시작되어서 야스퍼스 Jasper 에 이르는 현대 독일 철학가들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그전까지의 독일 관념론에 모조리 구체적 현상들을 로고스화해서, 일반적 논리 속으로 분석해 버리는 것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생명을 다루자는 “생의 철학” 운동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생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과 그가 관련되어 있는 전체와의 구체적 의의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하나의 현상 분석 또는 해석학적인 접근이 실존 또는 현존재의 철학이었다. 개개의 소여 所與에 대한 구체적 추인정 추경험을 통한 확인을 주로 하는 것이다. 존재에 대한 사색은 훨씬 더 사물에 가까워진, 말하자면 피가 통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다만 개개의 존재와 피가 통하는 추경험의 중시 때문에, 개개의 존재에서 그칠 우려, 그리고 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성에 눌려 지성의 작용이 경시될 우려, 이것이 실존철학이 짊어지고 있는 단점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그 개개의 것을 “전체”에서 살펴보려는 의도와 의지가 끈덕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개개의 구체적 검토에 그치지는 않고, 다시 그 존재의 근거와 의미를 캐려드는 것으로서, 실존철학은 그 태도와 의도에 있어서는 진정한 형이상학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철학이 성립되기에는 현대 철학의 창설자 독일의 훗설(Edmund Husserl(1859~1938)의 현상학 phenomenology 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 즉 그는 이 장에서 살펴본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대철학의 모든 잡담들을 다 집어 치우고, 우리 의식에 주어진 대로의 현상을 우리 의식에 주어진 대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구성 construction 과 사변 speculation 에 선행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 구성과 사변은 이렇게 의식된 것은 의식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행해져야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래서 관념론과 실재론의 피안에서 “엄밀과학으로서의 철학”을 수립하려 했던 것이 훗설이었다 그 결과 현상학적 방법이란 현상학적 환원, 다시 말해서 모든 주어진 것을 절대의식으로서 그 주어진 근원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인간 중에 영원한 것을 발견했고, 우주 안의 인간을 발견했고, 직관의 힘을 크게 경험에 앞세워 절대의식의 근원을 밝혀내려 애썼다.
실존철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인간의 현상학적 자기분석이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존을 존재로 중시하자는 것이다. 하이덱거는 생각했다. 인간은 존재와 존재이해가 마주치는 유일한 장소이다. 이 자기이해와 존재이해가 합일되는 특질을 까진 존재가 현존적 즉 실존이다. 따라서 실존철학은 이 실존을 해석학적 분석에 의해서 존재를 천명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천명은 존재자를 추상적으로 분해한다든지 개념적으로 분석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실존을 자기 현실성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서 자기를 존재로서 파악하는 일이다. 따라서 실존철학은 성립된 체계로서 “있는”것도 아니며, 주어진 것도 아니며, “그때 그때 새로 생기는 것이다.” 실존은 자기 자신의 완성과 실현에 있어서, 자기 존재와 자기 근거와 자기 의미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존철학은 “생의 철학”의 진보이기도 하다. 실존은 구체적 생과 구체적 자기실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존은 자기를 주어진 모든 가능성으로서 인식하고,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실현의 책임을 짊어진다. 이래서 실존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관념이 “결단”에 도달한다. 실존은 그것이 존재의 의미와 근거로서, 또한 가능성으로서 인식한 것을 긍정하고, 그 가능성을 향하여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존재 인식이 아니라, 존재에 의하여 협의의 형이상학과 결단으로서의 윤리학과 존재에 근거를 둔 근본적 생활태도로서의 세계관이라는 묵은 통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또한 존재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는 인식은 형이상학을 다시 낳은 큰 발견이었다. 그리고 이래서 실존은 “상태-이해-말” Befindlichkeit- Verstehen-Rede 이다.
감정・기분과 가능성과 결단・각오를 이렇게 표현한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던져진 존재”가 됨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 생성의 3단계로서 살펴볼 때에, 실존은 “세계 내 존재”, “던져진 존재”, 그리고 “죽음을 향한 존재” Sein zum Tode 이다. 이래서 실존은 또한 거기를 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이것은 실존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을 뜻하며, 이로 말미암아 인간존재의 역사성의 무제가 매우 뾰죽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이덱거를 이어 받은 야스퍼스는 “초월”의 문제를 더욱 중시한 데 특색이 있었다.

실존주의와 실존철학은 우성 구별되어야 한다. 실존주의란 2차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의 샤르트르 Sartre 가 “인간이 자기를 역사와 함으로써 인간 전체에 관해서 그 시대의 인간 전체에 던져진 시대적 특수성의 외침”을 가지고 인간혁명과 사회혁명을 부르짖는 철학적 문학적 사상운동이 붙여진 현대 유행사상의 하나였다. 거기에 대해서 실존철학이라 야스퍼스가 자기 철학에 붙인 이름이며, 하이덱거는 자기 철학을 “현상학적 존재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존 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철학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 실존철학이었다. 그리고 실존주의도 최근 광범위해져서 실존 의식에서 출발하는 철학 문학 예술도 다 포함하는 말도 된다.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존재의 자각적인 현존이 바로 실존이었던 것에서, 다시 초월을 향하여 치닫는 야스퍼스(1969년 작고)는 20세기의 정신적 위기와 인간적 소외에 대한 탈출구를 찾으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아직도 하루도 평화와 공존의 안전감을 찾지 못하는 20세기의 비극을 살고 간 지성인은, 혼란과 절망을 탈출하기 위한 현대의 비판을 우선 예리하게 했다. 고도 기술사회 특유의 기계화・집단화・평준화 경향에 따라 우리는 누구와도 바꿔칠 수 있는 대중의 한 번호에 지나지 않고,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개성과 자유는 아라비아 숫자가 되고 만 이 20세기에서 살길을 찾다 보니, 야스퍼스는 존재를 3차원으로 살펴서 세계・실존・초재(초월자)를 보고, 이 “초재” 즉 초월 존재를 인간에 숨겨진 신성 또는 신 신앙의 경향으로 보고, 신 없이는 실존의 우연성은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알고자 하는 인간이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적인 반항정신을 가지고 신이 간직하고 있는 존재의 비밀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며, 여기서도 “던져진 존재”인 우리가 세계에 부여된 괴로움에서 비판 속에서 염세주의가 아닌 생명에의 존경을 찾는 길이 여기서 더욱 절실히 느껴졌고, 이 점에서는 슈바이쳐(1965년 작고)가 윤리적 세계와 인생의 긍정에 더 충실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실존철학과 일단 구별될 수 있는 실존주의라는 유행사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나는 “세계 내 존재”, “던져진 존재”, “죽음에의 존재”인 그 실존이 초월존재 즉 초재가 되려면, 유신론으로 가느냐 무신론으로 가느냐의 양자 택일밖에 없게 되고, 무신론으로 가겠다는 주장이 바로 사르트르의 주장이었다. 즉 그는 “세계 내 존재”로서 속박된 구체적 개별적 인간의 실존만이 문제되고, 그것은 어떤 보편적 원리에서도 글어 낼 수 없는 본질 Sosein 에 앞서는 바로 거기 있는 Desein=현존재일뿐. 따라서 실존은 부조리 absurde 이며 우연적 contingent 이다.
인간은 이러한 시론으로서 자신을 내어던지는 작업이며, 스스로 만드는 무엇이며, 여기에 실존의 자유가 있다고 사르트르는 말한다. 따라서 야스퍼니나 슈바이처와는 달리, 실존주의의 특징은 세계의 합리적 합목적적 설명에 대한 실존의 레지스탕스라는 점이다. 따라서 절망, 불안, 허무, 부조리가 사르트르, 카뮈 Camu 등의 표어고, 그것은 니체적인 도는 히피 Hippies 족속의 (그들이 무슨 사상을 가졌다면) 사상적 원조가 될지 모른다. 한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대해서 마르셀 Marrcel 등의 카톨릭 실존주의 야스퍼스 등의 프로테스탄트 실존주의도 있음은, 실존철학의 본질상 당연한 귀결이었다.